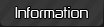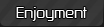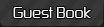제가 제일 존경하는 국사선생님의 글입니다.
가슴에 와 닿아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시길...
참고로 이 고등학교는 그 유명한 문근영양이 다니는 그 학굡니다.
버스타고 통학하는지라 맨날 보죠..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뒤편에는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집이 맨 위층이라 북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그 학교의 전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교실마다의 환한 불빛, 잔디가 곱게 깔린 아담한 운동장, 그 주변으로 정원처럼 가꿔진 숲들... 저런 곳에 -학교가 아닌- 우리 집이 있다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옆, 그 학교의 입구에 철로 된 구조물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교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좋은 곳에 터 잡은 그 학교에 지금껏 교문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교문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꼭 있으란 법은 없지만, 번듯한 교문 하나쯤은 있는 게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교문의 생김새가 어디서 많이 본 듯 했습니다. 세모꼴이 아닌, 반원형의 모습만 다를 뿐, 서울대학교의 교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문 앞에 서서 그것의 형태를 보면 바로 ‘서’로 읽게 되는 겁니다.
누가 고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학교 고유의 이미지를 서울대학교가 지니고 있는 그것이 대체하고 이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봤던 ‘눈’이 정확하다고 하면, 코미디가 따로 없는 일입니다.
무릇 학교에는 건학이념과 교훈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이 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실 속에서 서열화된 ‘학벌’이 맹위를 떨친다기로서니 그것에 항복 선언하듯, 교육 본연의 목적에 단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 씁쓸합니다.
어느 교육학자가 말하기를, 교육이 굳건한 철학 없이 현실주의와 관념주의에 매몰되면 그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급진적-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는-인 사회학자는 현재 우리 교육은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다고 단정짓듯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교문을 통해 이런 선정적인(?) 주장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물론, 그 ‘작품’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들만을 애꿎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 속의 작은 단위로서 학교 역시 현실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수 년 전보다는 훨씬 유연해진-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교묘해진- ‘학벌 관념’ 탓에 같은 지역사회 내의 다른 학교를 비방하고, 심지어 해코지하는 사태는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류대를 ‘통념’ 하나로 묶어 규정한 채 플래카드를 앞다퉈 내걸고, 집집마다 승전보의 찌라시(?)를 돌리며, 환상에 빠진 학부모들의 눈과 귀에 추파를 던지는 양상이 계속되는 한 학교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는 아직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
지금도 스승의 날 즈음이면 찾아뵙는 한 은사님이 제게 입버릇처럼 해주시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곪아 썩어 문드러져도 학교만큼은 깨끗함을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미래를 생각해볼 수는 있다.”
‘공’을 교사들에게 넘기는, 너무나 가혹한 일갈입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우라는, 탁한 못에 연꽃을 띄우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지나친(?) 요구이긴 하지만, 이 땅의 교사로서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제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는 어쩔 수 없다고들 말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지만, 교사만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마지막(?) 이상주의자로 남아야 하지 않을까요?
2005년 새해, ‘서서히 침몰해 가는 배’를 뼈저리게 느끼고, 물새는 곳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흔들리는 키를 부여잡고 다시 띄우는 원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험난하고 고된 그 일의 한 가운데, 교사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