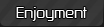10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저는 그때의 수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그렇게 학교를 떠나가셨지요..."
2년 전쯤...무심코 튼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웬지 마음이 닿아 귀를 기울였다.
"그때 그 선생님은 저희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이 노래는 제 가슴에 푸르게 살아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운 강혜원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 '상록수'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화악.. 가슴에 불이 그어진 느낌이었다. 나의 눈가가 시큰해졌다. 그리고 10년 전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 교실, 학교를 떠올리고 있었다.
1989년에 내가 가르친 아이들은 1학년 여중생들이다.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잠을 덜 자 피곤한 날에도 수업 한 시간만 하고 나오면 가뿐해졌다. 감기 기운이 있어 몽롱한 날에도 수업을 하고 나오면 상쾌했다. 교무실에서 언짢은 일이 있어도 교실에 들어가면 모두 털어내고 나올 수 있었다.
사실 나에겐 힘든 시절이었다. 전교조가 결성될 무렵이었기에 학교 안팎에서 부딪칠 일들이 너무 많았다. 내 주변의 팽팽한 긴장감이 갑갑해 견딜 수 없는 날들도 많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나를 위안했다. 시를 읽으며 눈빛이 빛나던 아이들, 노동하는 동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던 아이, "그대여 슬퍼하지 말아요.'라고 시작하는 괴테의 시를 낭송하며 지친 내 마음을 쓰다듬어주던 아이...
그때 아이들과 함께 한 국어 시간은 나의 천국이었다. 교사의 기쁨을 한껏 누리던 때였다.
내가 학교를 그만두게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아이들은 울면서 매달렸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아이는 없었다. 내 책상에 쌓이던 편지들, 우편함을 채우던 편지들....마지막이라 여기며 해야했던 여름방학 직전의 수업들....
그 여름이 가기 전,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 전 나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개학을 사나흘 남긴 8월 18일...
그리고 그 뒤 가끔씩 아이들이 다 돌아간 밤.. 학교 주변을 거닐다가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터뜨린 날도 있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복직을 하고 나서도 나는 그 학교 근처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아이들 편지를 통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알았다.
나의 대학 후배되는 사람이 그만둔 내 자리에 강사로 왔었다. 아이들은 국어 선생님 대신 다른 선생님이 왔다며 그 강사 선생님을 괜히 미워했단다. 수업 시간 내내 딴청을 하고, 필통이나 다른 물건을 떨어뜨려 시끄럽게 만들고, 내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을 노려보고... 결국 그 강사는 한 달 뒤에 그만두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또 상처를 받았다. 이중의 상처를 받은 셈이었다. 피해자였던 자신들이 가해자가 되는 모순의 경험이 바로 상처였다.
나와 함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그 아이들.....나를 너무나도 따랐던 아이들... 나를 믿어주었던 아이들... 교사로 살면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준 아이들....그때 내가 아이들과 함께 [상록수]라는 노래를 불렀었구나.
노래가 나오는 내내..그리고 한참 동안 나의 눈시울은 젖어 있었다. 10년 전의 그날들... 그리고 10년의 시간들...
방송이 끝난 뒤 나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그 프로그램 담당자를 찾았다. 이런저런 사연을 들었는데 그 사연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있느냐고... 연락을 해주겠다던 담당자는 종내 연락이 없었다. 나는 알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다.
그 노래로 나와 아이들은 삶의 길목 어디에선가 만난다 여기며......
<상록수 - 양희은 >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 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