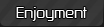흐음.... 현재 글도 잘 안올라오니 저라도 한미르에서 열실히 삽질해서 퍼와야되겠군ㅇ...(퍽)
------------- Start ----------------
그녀의 메세지
"꼭 가야 하는 거야?"
신욱이 아쉬운 눈빛을 발하며 다시 한번 물었다.
"..."
정아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욱은 그런 정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저..."
그는 말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정아가 고개를 들자, 그는 말했다.
"아, 아니야. 아무 것도..."
정아는 그런 신욱을 보며 뭔가 물으려다 또한 입을 다물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 줄 모른다.
신욱은 그 다음부터의 이어지는 침묵과 정아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에 몸을 실을 때 내밷은 한마디 말고는 아무 기억이 없었다.
"문자 보내..."
신욱은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도로를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다.
신욱에게 있어서는 친구 아닌 친구였던 정아였다.
얼마 전 같이 핸드폰을 샀을 때, 그는 확실히 느꼈다.
정아는 그에게 있어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 핸드폰 같은 걸로 가지지 않을래?"
신욱이 몇 번의 망설임을 거듭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래! 그러지 뭐..."
웃으면서 흔쾌히 대답하는 그녀를 보는 그의 심정은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다.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할 수 있을까.
역시 나는 그녀에게 있어 편안한 친구로 밖에 남지 못할 것인가...
정아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갈 때에도
그는 그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그에게 밀려 들어오는 후회스러움은 왜일까...
다신 그녀를 못 볼 것도 아닌데...
몇 주만 지나면 다시 그녀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데 이 불안함은 왜지?
다신 그녀를 못 볼 것 같은 이 불안감은...
9시.
신욱은 힘없이 문을 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쉬고 싶다는 생각 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없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무의식적으로 리모콘을 찾아 TV를 켰다.
[.......으로 가던 버스가 도중에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여기에 사망자는 21명, 중상을 입은 환자는 모두 7명으로
지금 ㅇㅇ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명단을 발표하자면...]
갑자기 그가 TV를 껐다.
'흔한 접촉 사고로군...'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침실로 향하던 그의 발이 갑자기 멈췄다.
그의 옆에 핸드폰이 뒹굴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 정아를 떠올렸다.
'문자나 보내 볼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 핸드폰 위로 손을 굴렸다.
"왔다! 왔어!"
그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채,
서둘러 수신함을 들여다 보았다.
그가 그녀가 떠난 후 문자를 보낸지
1주일 째.
그 동안 연락한번 없던 그녀에게 드디어 문자가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기대에 부풀어 수신함을 열어 보았을 때,
기쁨으로 충만해 있던 그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다.
[나야...]
이것이 그녀의 문자 전부였던 것이다.
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가 문득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정확히 12시였다.
내일은 그녀를 못 본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는 정말 정아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이젠 눈을 감아도 떠도 보이는 것은 정아의 얼굴 뿐이었다.
그 동안 그녀에게서 온 문자는 대개 그의 안부를 묻는 것들이었다.
[잘 지내?]
[건강하지?]
등등... 하지만, 이상한 건 문자가 매일 밤 정확히 12시에 온다는 것이었다.
신욱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씩 건너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그녀는
정아와 비슷한 눈빛을 찾기 위해 그러는 것이었다.
신호가 바뀌자 그와 건너편 사람들과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가 횡단보도의 중간 쯤 다다랐을 때,
그의 귓가에 허스케하지만서도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쯧쯧... 젊은 나이에 처녀 귀신을 달고 다니는 군..."
그는 귀가 번쩍 뜨여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허스케한 목소리를 가졌다고 생각 되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그냥 가려다 다시 돌아보자 그의 눈에 하얀 모자가 눈에 띄였다.
'저 사람이야...'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에 어렴 풋이 비친 하얀색...
그는 하얀 모자를 목표로 달려 갔다.
그가 모자를 낚아 채고 모자의 주인이 돌아 본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그를 향해 웃고 있는 할아 버지 였다.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은 정아가 죽었다는 건가요?"
신욱은 떨고 있었다.
두려움과... 슬픔과... 정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
그를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그를 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정말이네... 그것도 일 년 전에... "
일년 전... 일년 전...
갑자기 그의 머릿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맞아... 그날... 그 뉴스... 그 접촉 사고...
그래... 그건...
신욱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어제 밤에 보낸 그녀의 문자가 생각 났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니... 그건 무슨 뜻일까...?
할아버지는 그의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환생을 하게 되네...
그리고 그 환생을 하려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지...
그 시간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틀리네...
이 아가씨는 아마 1년의 기간 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 같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고 말야.
어때... 내말이 틀린가?"
"어떻게 1년이 남았다는 걸 알았죠?"
신욱이 물었다.
떨리던 그의 몸은 다시 침착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녀를 살리고 싶은 의지로 가득 찬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그의 그런 눈빛을 보며 부질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자네 주위에 떠있는 그녀의 기운이... 사라지고 있네."
노인은 떠났다.
그녀도 떠났다.
하지만 신욱은 아직도 믿고 있었다.
신욱은 이미 바닥이 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억지로 짜며
그녀의 부산 집의 전화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다.
"뚜르르르.....뚜르르르... 찰칵!"
"여보세요..."
여자 아이의 목소리였다.
신욱은 떨리는 가슴을 억지로 진정 시키고 말했다.
"거기... 정아 언니 있니?"
한참 동안 전화기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 오지 않았다.
신욱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의 죽음을 확신해 가는 자신을 질책하며
조용히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아이의 대답이 들려왔다.
"언니 이제 여기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딸칵!"
신욱은 핸드폰을 들었다.
아이의 대답을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그는 언제나 불통이었던 그녀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길 원하면서...
하지만 역시 불통이었다.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사오니...]
그는 그냥 끊으려다 말고 한 가지 결심을 한 듯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그가 2번을 눌렀다.
[음성 사서함을 남깁니다. 삐 소리가 난 후...]
그는 말소리가 끊나자 심호흡을 한 후 말했다.
그가 그토록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정아야, 사랑한다."
신욱은 부산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오늘은 그녀가 그의 곁을 떠난 지 일 년 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아까 한 아주머니가 했던 말을
곱씹어 보고 있었다.
"이런 말 하기 좀 뭣 한데... 그 아가씨 죽었을 때
손에 왠 핸드폰이 꼭 쥐어져 있더라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빼 보려고 했지만
아, 글쎄 그게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 아가씨 소원인가 보다...하고 그대로 묻어 줬어."
그는 시계를 보았다.
12시였다.
오늘은 그녀의 마지막 날인가...
이젠 믿어야 겠군... 내 눈으로 확인 까지 했으니...
"응...?"
그는 자신의 핸드폰이 놓여져 있는 탁자에 놓여져 있는 또 하나의
핸드폰을 발견했다.
"이건...?"
자신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는 신호가 울렸다.
그녀의 메세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었다.
뚝...
뚝...
그의 핸드폰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의 손 위로 그녀가 보낸, 그녀의 마지막 메세지가 보였다.
[나도 사랑해... 안녕]
---------------- The end ---------------
언제나 골칫거리가 되고있는 이 스크롤의 압박이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