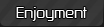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첫글 올립니다.
달랑 인사만 하기 뭣하고 해서..
낭만고양이를 실제로 만나본 분의 회고록(맞나?)을....
밤길을 막연히 걷고 있었다.
그때 누가 날 불렀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때 구룡포는 어둡고, 막막했다. 그 흔한 가로등 하나 없었다.
보이는 불빛이라곤 저 바다 안쪽에 등대 하나뿐이다. 라이터라도 키고 가볼까
하다가 담배생각이 났다. 잠시 멈춰 불을 붙이다가 저앞에 무언가가
길을 막고 서있는걸 발견했다.
".....뭐지?"
놈은 나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고양이 한마리였다. 건방지게도 사람이 걸어가는
길 한가운데를 막고 앉은 하얀털 고양이. 쳇. 그냥 지나가려는데
놈이 대답을 했다.
"그러는 넌 뭐지?"
걸음을 잠시 멈췄다. 길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
달빛이 환하다. 달이 참 곱네. 나는 달을 보며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서
담배연기를 길게 내 뿜었다. 목이 따끔거린다. 말하는 고양이라. 귀찮은 녀석이군.
"길... 좀 비키지?"
나는 진지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길을 비켜주지도 않았다. 놈의 꼬리를 넘어, 가던 길을 재촉하려던
순간이었다.
"인간놈들이란.."
"......."
난 물고있던 담배를 뱉았다. 퉤. 고양이는 가만히
내버려진 꽁초를 바라보다가,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어둠속에서 더욱 빛나는 눈빛. 난 천천히 그에게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고양이."
"나도 한 대 주겠나?"
"......"
가만히 고양이를 쳐다보았다. 어둠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온통 하얀 털. 난 말없이 고양이에게 담배를 물리고 불을 붙여주었다.
저정도면 먹을 만큼 먹었겠거니. 담배를 받아 물고
한동안 연기를 들이마시던 녀석이 내게 말했다.
"이봐. 인간. 너 사랑을 해 본적이 있나?"
"......"
"나는 해본적이 있지. 그런데 넌 아무래도 애인하나 없을것 같이 생겼군..
비쩍 말라가지고 말야."
나는 녀석의 옆에 앉아 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피식 웃었다. 눈에 연기가
들어가 매웠다.
"그런데 오늘 그 녀석이 죽었지. 같이 배를 타기로 약속했는데 말야.
내가 그물을 치면 그녀석은 고기를 잡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말야."
녀석이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마지막 연기를 도넛 모양으로 뱉으며 놈이 말했다.
"이봐 인간. 내게 술을 좀 사주지 않겠나"
편의점에서 맥주 3병을 사들고서 나는 고양이를 구룡포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갔다.
아직 모래는 따듯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이빨로 맥주를 땄다.
"따라줄까?"
"촌스럽군. 난 병째 마시겠다."
"병도 못잡는 놈이.."
"....그럼 따라줘봐"
얼마나 마셨을까. 어둠이 저멀리서 덮쳐온다. 파도소리 너머로
맞은편 항구에서 출항준비를 하는 어부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생선가게 고양이였어. 거길 내가 맨날 털었거든"
"......"
"그러눈으로 보지마 인간. 난 태어난지 한달되던때 부터 혼자 먹이를 구해야
했다구. 배가 고프다 보면 그까짓 생선가게 하나 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도로에 눌러붙은 강아지시체 뜯어 먹는것보다야 훨씬 쉽지."
고양이는 종이컵을 한번 핥고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거 알아? 내가 자란 뒷골목에선 말야. 하얀 고양이는 재수없는
존재야. 눈에 잘 띄거든. 그래서 항상 독고다이였어. 혼자 자고.
혼자 먹고...뭘 하든 혼자 했지. 그러다 그녀석을 만난거야.
암튼 그녀석..
나중엔 주인몰래 제 밥을 나눠주기도 했지. 곱게 키워졌지만
사가지가 있는 녀석이었어...덕분에 더이상 배고프진 않았지.
쓰레기통 뒤지는건 정말 싫었거든."
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도둑 고양이 주제에 좀 별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친해졌었지.저기 선착장에 오징어잡이 배들 보이지?.
저길 항상 같이 갔었어. 환한 불빛아래에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치 그게 말야.. 바다위로 걸어갈수 있는 길이 보이는것만 같았어.
죽이지 않아? 바다를 걸어갈 수만 있으면 그까짓 생선가게 따위야 애써
털 필요도 없잖아.."
녀석은 키득거리며 말을 이었다. 나는 두번째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녀는 항상..... 배를 타고 싶어 했어. 새파란 바다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더군..시커멓고 냄새나는 부둣가 바다 말고 진짜 바다 말야.
그러면 항상 내가 철없는 녀석이라고 놀렸어. 니가 곱게 자라서
그런거야. 라고 그러면 금방 울것 같은 얼굴을 하곤 했다구 그녀석...그런데..."
배들이 하나둘씩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고양이도 취해가고 있었다.
녀석의 잔을 치우며 물었다.
"사고였나..."
".... 사고였지."
고양이는 남은 술을 한참이나 정성들여 핥았다. 취하고 싶은모양이다.
나는 내버려 두자고 마음 먹었다. 잠시 일어나 얼굴을 항구로 향했다.
밤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구룡포 항구에 밤이 온다. 오징어를 잡는 배들은 일천이백
사십개의 나트륨등을 일제히 밝혔다. 수십대 디젤엔진이
진동하는 소리. 대낮보다 더 밝은 밤이오면 항구는 꿈이된다.
벙커C유로 피갈색이 된 바다는 빛나는 실크 커튼이 된다.
바짝 마른 불가사리의 시신들은 커튼에 박힌 별이된다.
일천이백사십개 은하계를 짊어진 오징어배의 무리는
어느 노래속에 나오는 마법의 성이 된다.
밤바람에 휘날리는 쓰레기들은 쏘아올린 불꽃이 된다.
불꽃들 사이로 부신 눈을 비비는 어부들이 분주하다.출항이다.
녀석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어떤 인간이 그녀석 밥그릇에 소주를 부었다는군.... 횟집이었거든..
모르고 먹은거야. 바보같이.... 고양이들은 술을 마시면 죽는다는것도..
몰랐던거야.."
"술?"
나는 기침하듯 물었다. 켈룩.
"그래... 나같은 거리 출신들은... 다 아는 거지..우리 고양이들은
술을 마시면 죽어... 우리 엄마도... 누가.. 토해논 찌꺼기를...먹고 죽었지..
....그대로 잠이 들어선.. 며칠이고 ...일어나질 않더군"
고양이는 자기앞에 술병을 만지작 거리며 말했다.
나는 한참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대답했다.
"그랬군"
"고마웠어... 인간."
고양이는 풀썩 쓰러졌다. 녀석의 배가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을 바로 눕히고 물었다.
"이름은?"
"..그런거. 없어... 그녀는. 날. 항상. 슈피. 라고. 불렀지."
"남길말은?.... 슈피."
"담. 배를."
담배에 불을 붙여 슈피의 입에 물려줬지만 빨아 태우지 못한 담배는
곧 해풍에 꺼져버렸다. 슈피의 배가 느릿한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
나는 가만히 그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출항 나갔던 배들이 하나 둘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밤새 바위섬에서 바람을 피한 갈매기들이
뱃머리를 따라 나르고 뱃소리에 잠을 깬 누렁이들은 볼멘 소리로 짖어대고있다.
짧은 항해의 흔적들 뒤로 멀리 아침이 오고있었다.
슈피의 배가 몇번 물결치다가 이내 잠잠해 졌다. 녀석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바닷가의 아침햇살을 받으며 잠들어 있다. 마치 그렇게 보였다. 꿈을 꾸는 듯
녀석의 입가가 미소짓는다.
며칠 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물던 나는 그날도 오징어잡이 배들의
출항을 보게 되었었다. 수십개 환하디 환한 불빛을 달고서 어둠을 지나
바다로 달리는 작은 배 한척. 담배가 꺼져갈때쯤 나는 뱃머리에서
나트륨등의 빛깔과는좀 다른, 훨씬 작은, 네개의 흔들리는 불빛을 발견했다.
달빛아래 반짝이는 별빛처럼 그 작은 빛들은 둘씩 짝을 지어
마치 춤을 추듯 갑판위를 휘돌고 있었다. 나는 담배연기를 길게 뿜으며 가만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달빛이 무척 고운 밤이었다.
...이 이야기는 작년 여름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못믿겠다면 여기 슈피의 마지막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린다
http://boardr.sayclub.com/files/boards/blob2/sayclub/ji-/du-/kr-/jidukri/b1-/b12/1./%BD%C7%BF%AC%B4%E7%7E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