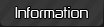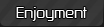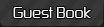※ : 스크롤의 압박이 있음..
본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검의명청
손잡이 => 힐트(hilt)
날 : 블레이드)blade)
손잡이 머리부분 : 폼멜(pommel)
잡는 부분 : 그립(grip)
키용 : 가드(guard)
검날의 명칭
슴베 : 탱(tang)
어깨부분 : 숄더(shoulder)
날 최상부 : 포르테(forle)
홈 : 풀러(fuller)
날 중간 부분 : 미들 섹션(middle section)
휜 부분 : 포이블(foble)
날의 절단 부분 : 커팅 엣지(cutting edge)
날끝 : 포인트(point)
바스타드 소드
(Bastard Sword 혹은 Hand and a halr sword)
모양과 사용법
바스타드 소드란 한 손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양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가 긴 검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 앤 어 하프소드(Hand and a halr sword)라고도 불린다. 한 손 또는 양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바스타드' 즉 '유사(類似), 잡종'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전체 길이는 115~140Cm, 날의 폭은 2~3Cm, 무게는 2.5~3kg 가량이다.
바스타드 소드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한 손과 양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방패를 들고 전투하다가 만일의 경우에는 방패를 버리고 양손에 힘을 줘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양손 검과는 달리 검이 크지않아 기동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충분히 방어 할 수 있는 방어도구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손잡이가 긴 만큼 균형을 잡는 법이 롱 소드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역사와 세부내용
바스타드 소드의 본격적인 등장은 13세기경이라고 하는데, 특히 독일과 스위스에서 발전하여 17세기 중엽까지 사용되었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영국과 독일에서는 비교적 심플한 모양이고, 스위스에서는 손잡이에 동물 무늬를 넣어 모양이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기사들의 검은, 양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검일지라도 허리에 차고 있으면 양손 검이라고 부르지 않고 롱소드나 바스타드 소드라고 했다. 한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양손 검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던 흔적은 바스타드 소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검의 허리에 차는 것이 당시의 검을 다루는 기사의 상식이기도 했다.
바스타드 소드는 한 손으로도, 양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 검도, 양손 검도 아니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어졌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왕조의 펜싱 마스터 '요셉 스위트남(Joseph Swetnam)'의 저서(The Scboole of tne Noble and Worhby Science of defence)에 "바스타드 소드는 롱 소드와 쇼트 소드의 중간에 위치하는 검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 점에 근거하여 스위스의 문헌을 조사해보니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15세기경 보병이 사용했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날끝이 예리한 찌르기 전투 전용의 검과 함께 양손으로 사용하는 무거운 검이 번성했으며, 이러한 검의 사용법과 목적은 베기와 찌르기, 이 두 가지 모두를 행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양손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 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검은 이 두가지를 효과적으로 구사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당시 스위스 용병들은 자신들의 *파이크전술을 구사하면서 전면에 할베르트(할버드,핼버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위스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그때 그들이 바스타드 소드에 대해 가졌던 인상이다. 그들은 바스타드 소드는 베기에도 찌르기에도 적당했다고 표현했다. 당시 검의 용도로 베기에 적당한 검은 게르만계이며, 찌르기에 적절한 검은 라틴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바스타드는 그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만일 요셉이 롱 소드를 베기용으로, 쇼트 소드를 찌르기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말한 '중간에 위치하는 검'이란 의미가 바로 스위스의 해석과 연결된다. 이 해석에 따른다면, 양손으로도 한 손으로도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명칭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파이크전술 : 기병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어전술인데, 스위스 용병대는 충분하게 훈련한 결과 파이크 전술의 결점인 기동성을 극복하여 공격면에서도 사용하는 데 성공했다, 기본적으로는 파이크를 소지한 병사들이 모여 밀집군을 형성하면서 파이크를 들고 고슴도치처럼 하나가 되어 적을 상대하는 전술이다.
(리드의 한마디 : 여기에 대포한번 쏘면 전멸일탠데..하지만 이때는 대포가 없었다죠..아님 하이템플러를 불러서 사이오닉 스톰으로..(빠각!!))
부록 : 라틴풍과 게르만풍
검의 날 부분을 라틴풍이나 게르만풍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베기'가 목적이면 게르만풍, '찌르기'가 목적이면 라틴풍이 된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했고, 찌르기에 썼던 검일지라도 베기에도 썻기 때문에 이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 즉 '베기'인가 '찌르기'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다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굳이 강조하자면 날끝 부분이 예리하며 날카롭고 일직선으로 곹은 것이 라틴풍의 칼날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검의 세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것은 '라틴풍'이기로 하고 '게르만풍'이기도 한, 이들 중간에 위치하는 검의 탄생인데 '베기' '찌르기' 이 두가지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검의 지위를 창조해냈다. 그것은 아마 바스타드 소드 였을지도 모른다.
(리드의 한마디 : 우리나라의 검은 날이 한쪽이였으므로, 베기목적인 게르만풍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다크템플러도 게르만풍인가..(빠각!! 서걱!! 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