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은 플레이트 메일, 링 메일, 스케일 메일 등 많은 갑옷들이 발명되었는데, 이것때문에 기사 중심의 전쟁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기사 중심의 전쟁에 의해서 기사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갑옷이 발달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양의 전쟁 방식은
1. 양 측에서 대표 기사가 나온다. <대개 소규모 전쟁에서는 기사가 1명만 있는 경우도...>
2. 마상에서 전투를 한다. <이 때 돌격하여 창으로 이기든, 검으로 이기든 상관은 없다.>
3. 한 쪽 기사가 무너지면 상대측은 기사를 선봉으로 돌격한다. <대표 기사가 무너졌으니 무너진 쪽은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일...>
이런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 와중에 화살이 날라온다던가, 예상치 못한 일로 기사가 죽을 수도 있지요.
어찌하였든 이런 방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기사의 갑옷은 특히 중요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갑옷을 더욱 더 튼튼히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사의 갑옷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서는 강철 보다 갑옷을 만들기에 적절한 금속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철을 이용, 갑옷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기사 위주 전쟁이 발생한 후에도 강철이 귀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무리 날카로운 검이라도, 갑옷을 뚫기란 어렵고, 또한 날이 쉽게 닳아서 베는 용도로는 쓸 수가 없지요. 게다가 강철로 만든 갑옷은 무겁기 때문에 검을 사용할 때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베기형 검, 즉 도<카타나의 용도는 베기, 그런데 카타나는 보통 일본'도'라고 부르지 일본'검'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서양 사람들은 갑옷을 뚫고 사람을 베는 무기가 아닌, 갑옷을 이용, 기사를 전투불능으로 만드는 무기를 더 선호하게 된 것이지요.
그 예로 말에서 떨어뜨려 무거운 갑옷 때문에 기사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창, 갑옷을 우그려뜨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 데미지를 받게 하는 둔기, 베는 용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예리하게 날을 세우지 않고 그냥 검 형태로 만들어낸 양손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검을 베는 것이 아닌, 찌르는 용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점차 세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검 레이피어가 그 종류에 속하지요.
찌르기는 두터운 갑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그 느린 기사들의 공격을 피해서 갑옷의 관절부분만 노리는 용도로 많이 쓰이니까요. 따라서 세검은 점차 가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갑옷이 발달하다보니, 결론적으로 서양은 베기보다는 찌르기를 선호하게 되었고, 도 보나는 검을 위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빠각!) [설명이 너무 길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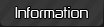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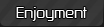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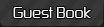
차라리 석궁 쓰세요.
철갑옷따윈 한방에 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