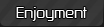'B급 좌파'는 저자인 김규항씨가 98년부터 씨네21이라는 영화잡지의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라는 칼럼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둔 책이다. 현실과 이상의 양극단의 중간에 선 어중간한 지식인으로써의 자신의 위치를 극명하게 드러낸 'B급좌파'란 제목에서 읽히듯,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현실과 문화적 현상을 좌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환부를 드러내며, 불만을 토로하며 변화를 촉구한다. 아무래도 영화잡지에 기고한 글인 까닭에 대부분 음악, 영화등 문화현상에 집중하고 있지만 간간히 생활에서 부딪히는 제도의 모순에 대한 담담한 고백, 정치적 이슈에 관한 치열한 논의 전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기억에 남는 몇가지 쟁점들.
1. '댄스음악'에 관한 이야기.
김규항씨는 우연히 길을 걷다, 대학로의 한 공원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학생들과 마주친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음악에서 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아쉬워하며, 이른바 음악을 좀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락'이라는 장르의 본질인 '저항정신'에 심취하고 있지만, 우리의 10대들은 '댄스'를 통해서 '락'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서구사회에서 '락'이라는 장르의 음악으로 기성세대의 완고한 질서에 저항했듯, 우리의 10대들은 '댄스음악'과 '춤'을 통해 자신이 부딪히는 어른들의 질서에 저항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쉽게 '빠순이', '빠돌이'로 치부해버리는 몇몇 학생들을, 그냥 생각없이 대중문화에 중독되어 버린 청소년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2. 조선일보에 관한 이야기들.
김규항씨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선일보 경멸주의자'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여러 다양한 의견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선의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인데, 조선일보는 이런 우리의 정치제도에 정면으로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신문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선일보 식의 사실의 왜곡은 범죄다..라고 단정짓고,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일련의 지식인들을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신문과 TV 등, 언론에 대한 나의 믿음을 꽤 많이 흔들어버린 내용들.
3. '민족'에 관한 이야기들.
이 책을 읽다보면, 여러번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앞에 썼던 글에서 자신의 오류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뒷글을 쓸 정도로 한국사회에서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묶여있는 나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끝내 변하지 않는 그의 논지는 '민족주의'는 위험하다! 이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되어서는 안 될 잘못이 쉽게 용서되고(예를 들어, 전두환 같은 사람이 일으킨 행동들.), 월드컵 경기라도 열리면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팀을 응원할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으며(만약 잉글랜드 팀을 응원하는 한국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당장 매국노로 몰리지 않을까.), 결코 같은 인종일 수 없는 대기업 회장과 극빈층의 자녀들도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화해한다. 이런 민족주의는 쉽게 '전체주의'로 전환되고, 이런 전체주의는 그 자체로 개인을 억압하고 희생시킨다. '한민족'이란 정체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쳐낸다. 교육, 의료, 육아, 사회운동 등등. 김규항씨는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분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글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가치기준은 양심이다. 내 양심을 건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의 양심까지 건사하는 것. 그래서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 이 책이 내게 영향을 끼친 이유는, 학문적 분석의 논리성이나 입장의 독특함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충실한 자세이다. 지금까지 쉽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나와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태도. 이 책이 나에게 의미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자잘한 교훈들 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