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낙원 한 귀퉁이에는 보리수 나무가 있었다. 붉고 작은 열매를 수없이 매달고 있던 그 나무. 그 나무에서 시큼달큼한 열매를 따 먹다 보면 나와 형제들의 혀는 붉게 물들었던 것 같다. 유독 그 보리수 나무가 생각난다. 배나무며 다른 과일나무도 몇 그루 있었던 것 같은데 유년 시절 내 낙원의 상징은 바로 그 보리수 나무이다. 보리수... 석가모니는 그 나무 아래서 해탈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나무 아래서 삶의 수심을 배워갔던 것일까? 아니 그 나무를 떠나고 나서 수심을 알게 된 것일까?
잃어버린 낙원... 나의 낙원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함께 하고 있다. 그렇다 유년 시절은 내 삶의 낙원이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시절을 보낸 집이 '언덕 위의 푸른 집' 마냥 꿈처럼 아스라하게, 아름답게 내 추억 속에 남아 있다.
어쩌면 온 하늘이 다 담길 것 같이 느껴졌던 연못은 초라하게 돌 몇 개를 괴어 놓은 장식 연못이었을 지도 모른다. 가끔은 시소가 되기도 하던 하늘 색 벤치(양쪽에 고임돌이 있고, 그 위에 나무를 놓았기에 시소처럼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그저 색칠한 나무 판대기였을 지도 모른다. 운동장처럼 넓다고 느꼈던 잔디밭은 지금 다시 보면 그저 작은 뜰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린 내게 그 집은 낙원이었고, 구름이 가끔 연못에 머물듯 내 꿈은 그곳을 둥실둥실 떠다녔을 것이다.
4살쯤부터 8살까지 나는 그곳에서 살았다. 그 집에 살면서 나는 집에서 우리를 돌봐 주던 언니 등에 업혀 동네 야학을 다녔다. '들국화가 곱게 피었습니다'라는 글귀가 보이면서 문맹과 작별하던 그 놀라운 순간을 경험한 것도 그 집에 살 때였다. 엄마를 찾아온 학생들(오빠들)에게 수줍게 물그릇이며 과자를 건네던 어린 나...고마워라고 말하는 그 오빠의 말에 한없이 가슴 벅차던 기억이 이 순간 떠오른다. 아아.. 그때 우리 어머니(엄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우셨던가. 엄마는 화를 별로 낸 적이 없었다. 그 집에 살 때는....
대식구가 모여 김장을 담그던 북적거리던 풍경이며, 고모들과 그림을 그리거나 꽃을 만들고, 퇴근하는 아빠 엄마 손에 들려진 무언가를 두근거리며 기다리던 일들... 그저 웃음이 가득했던 날들인 것만 같다.
내게 설움이라는게 있었다면 어린 동생이 철없이 내두른 주먹에 머리통을 한 두대 맞고 운 정도일 것이다. 내게 힘겨움이라는 게 있었다면 할머니 옆에서 자다가 천장에서 구렁이가 기어내려오는 것 같은 환각에 가슴이 답답했던 일뿐이다. 어린 시절엔 가끔 그런 환각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한다.
유년시절이란 인생의 낙원일 것이다. 이별이란 것, 서러움이나 괴로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유년이 아닐까? 아... 슬픈 거구나.. 삶은 슬픈 거구나... 아, 헤어짐이란 이토록 냉정한 거구나...아, 삶에는 이런 아픔과 쓰림이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삶의 낙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우리는 낙원과 작별을 고하게 된다. 바스콘셀로스가 지은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를 읽을 때 나는 어린 제제가 밍기뉴라는 나무와 작별하는 그 대목을 울면서 보았다. 유년 시절과의 작별, 낙원의 상실... 그러면서 우리는 커간다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낙원과 작별을 해야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려준 어떤 사건을 나는 이제 웃으면서 기억한다.
내게는 고모가 여러 분이다. 다섯 분이나 되었다. 큰고모 둘째고모는 아버지보다 먼저 결혼하셨고, 작은아버지들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장가가셨기 때문에 헤어짐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한 사람은 셋째고모였다. 셋째고모는 나를 무척 좋아했다. (다른 형제들도 다 귀여워 했겠지만, 나는 웬지 나를 더욱 귀여워 했다고 생각했었다. ) '셋째딸은 얼굴도 안보고 데려간다'는 속담이 맞는 건지 고모는 예뻤다. 또 멋쟁이었다. (옛날 사진을 보면 구두에 양산을 쓰고 목걸이를 한 고모의 사진이 있다. 나는 그 옆에서 레이스 달린 원피스를 입고 한껏 폼을 잡고 서 있다. )
어느 날 고모가 시집을 간다고 했다. 실감을 하지 못했다. 시집을 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데 어느 날 짐차가 와서 고모가 쓰던 짐들을 다 싣고 떠날 때 나는 고모가 시집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다. 고모는 내 곁을 떠나는 거였다. 우리집을 떠나는 거였다. 고모를 빼앗아가는 사람은 우리집에 자주 들락거리던 '오대위 아저씨'였다.
나는 짐을 보내지 말라고 울며 엄마에게 매달렸다. 막 통곡을 하고 발을 굴렀지만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오대위 아저씨 오면 내가.. 내가.. 때려죽일 거야."
흐느끼면서 나는 그런 끔찍하고 험한 말까지 내뱉었다.
며칠 뒤 나의 적(?) 오대위 아저씨가 왔다. 고모와 함께... 아, 그런데 나는 오대위 아저씨를 때리기는 커녕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고모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고모는 달라졌다. 오대위 아저씨와 다정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다. 나는 직감적으로 고모와 그 아저씨를 연결하는 질긴 끈이 생겼음을 알았다. 어린 내가 어쩌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니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그리고 알았다, 고모는 떠난 거야. 고모는 내게서 멀어진 거야...(지금 셋째 고모댁은 우리집에서 무척 가깝다. 어린 시절 나는 시집간 셋째고모 집을 자주 찾았고, 고모의 아들딸들.. 내 사촌동생들을 무척 예뻐했다. 고모 역시 나이 먹어가는 조카를 늘 걱정하고 아끼신다. 고모부 역시.... 후후... 내가 그때 엄청난 살의(?)를 가졌었다는 걸 아직 기억하실래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별이란 걸 겪은 나는 조금씩 유년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공간으로서의 낙원도 잃어야 했다. (아니 그것은 서로 엉켜 있는 것이겠지. 아니 공간은 그 시간을 상징해주는 것 뿐일지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우리는 그 집을 떠났고, 그 뒤로 나는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엄마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아픈 현실이 무언가를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가끔 혼자 이불 속에서 쿨적거리며 울기도 했다.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걱정했다. 그리고 어느틈엔지 죽음이란 개념을 알게 되어 죽음의 공포도 느꼈었다.
아아... 낙원에서 떠난 뒤 나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설움을 알게 되었던가. 삶이란 긴 고통 짧은 행복이라 생각하고... 수심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온전한 곳이 없을 만큼 다치고 아퍼야 삶이 끝나는 거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나... 그러나....나는 천상병 시인처럼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유년 시절의 기행>
노래-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제는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
오랜만의 유년시절의 나를 발견했지
저물 무렵 빈 운동장에 커다란 나무 아래서
운동화에 채이는 비를 보며 그 애와 웃곤했지
내가 떠나려는 것인지 주위가 변해버린 것인지
휭한 나의 두눈은 기억속의 너를 찾네
손때 묻은 가방과 어색한 표정의 사진들은
무뎌진 나의 가슴에 품은 기억을 깨우네
정든 학교를 떠나고 까만 교복을 입던날
혼돈스런 날을 보내며 조금 커가는 걸 느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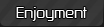


별 필요 없는것 같은 글(퍽)